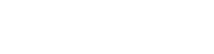고등학교 1학년 M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참지 못하고 욱한다.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이런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학교에서도 친구들은 M을 피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선생님들에게도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다. 집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니 집안 분위기가 형편없이 망가졌다. M의 이런 행동은 중학교 2학년쯤부터 시작되었다. 차츰 강도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M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에게 성적 때문에 야단을 맞고 억울함과 분노, 자책감이 함께 올라와서 견디기 힘들었을 때, 처음 주먹으로 벽을 쳤다고 한다. 손이 아프고 피가 나기는 했지만, 순간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했던 복잡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다음부터는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차츰 타인에게도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순간 상대가 움찔하는 모습을 보면 지배감, 통제감이 느껴졌다.M에게 그렇게 힘든 감정을 없애려고 써왔던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물어보았다. “벽을 치거나 하는 행동을 하고 나면 사실 순식간에 화나 억울함 힘든 감정이 일순간 해소되어요”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런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다. “사실 조금 지나면 다시 감정이 올라오기는 해요. 그리고 후회가 되죠. ‘내가 또 왜 그랬지’ 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욱하게 돼요” 하지만 일순간에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다 보니 감정이 힘들 때마다 습관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M의 경우처럼 감정이 활성화되어 강렬하고 압도적인 감정으로 올라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를 관리하고 싶어진다. 극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감정일수록 이를 최대한 빨리 차단, 중지하려 든다. ‘직감 반응’을 하는 거다. 이러한 감정 관리 전략이 반복되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쉽게 의지하게 되고 반복하여 습관이 된다.치료의 전락은 이런 ‘직감 반응’을 대신하여 ‘알아차리기’ 전략을 배우도록 돕는 거다. 비유하자면 ‘직감 반응’은 시끄러운 음악과 같아서 지금 당장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알아차리기’는 부드러운 배경 음악과 같다. 부드럽고 섬세하며,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장기적지난 해 12월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발전노동자들의 삶과 전환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2월 폐쇄되는 태안화력발전소와 2026년 폐쇄에 들어가는 하동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와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새알미디어가 공동제작을 맡았고 공공운수노조가 제작후원으로 참여했다.촬영을 총괄하는 남태제 감독과 태안과 하동을 각각 이인섭, 전찬영 촬영감독이 맡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살면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처음 만나 이야기 나눠 본다는 젊은 촬영감독은 "처음에는 이런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이었는데 우리 동네 평범한 아저씨들이랑 똑같던데요? 그리고 노동조합 하면 막 투쟁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 보니까 너무 다정하셔서 저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분들과 친해지고 싶어요"라고 했다. 기자회견하고 집회하는 모습, 회의하고 토론회 하는 모습, 잠시 동료들과 수다를 나누는 모습, 담배 한 대 물고 생각에 빠진 모습, 촬영팀과 인터뷰 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카메라에 담기고 있다.발전소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특히 가장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행동하고 전환의 주체가 되는지, 기후정의 시민사회와 함께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과정들이 담길 이 다큐멘터리는 향후 4년 동안 진행될 장기 프로젝트다. 절반은커녕 이제 시작단계인 시점에서 어떤 모습들을 긴 호흡으로 잘 담아낼지, 제작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이 과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그리고 2025년 6월 2일, 고(故)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사고 였듯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역시 예견하지 못한 사고였다. 2018년 12월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가 죽은 현장에서 또 다시 그런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는